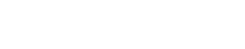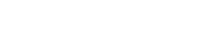아크테릭스가 메인 스폰서로 참여한 제5회 장수트레일레이스가 지난 4월 4일~6일까지 전북 장수군 일대에서 열렸다. 아크테릭스는 20km 코스에 집중해 브랜드 캠페인을 펼쳤다. 사진=아크테릭스 지난 4월 4일~6일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제5회 장수트레일레이스'가 열렸다. 경기는 장수군 일대 천상데미봉(1,020m), 팔공산(1,151m), 신무산(896m), 사두봉(1,014m), 장안산(1,237m) 등으로 이뤄진 70km, 38km, 20km 코스에서 열렸고, 총 2,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여기에 캐나다 프리미엄 아웃도어 브랜드 아크테릭스(Arc'teryx)가 메인 스폰서로 참여해 열기를 더했다. 20km 코스 시작점에서 펼쳐진 사물놀이. 아크테릭스 깃발과 묘하게 어우러져있다. 사진=아크테릭스 아크테릭스는 특히 20km 코스에 집중해 캠페인을 전개했다. 브랜드가 새롭게 정의하는 'Mountain Running'에 관한 메시지를 현장에서 직접 전달하는 한편 경기장에 마련된 현장 부스에서 4월 캠페인 'Steady Run'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또 아크테릭스는 제품 수명 연장과 자원 순환에 대한 브랜드 철학을 소개하기 위해 ReBIRD™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참가자의 트레일러닝화를 점검해주기도 했다. 20km 참가자들이 깃발 아래서 출발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아크테릭스 20km 종목이 열린 장안산 출발지점에는 사물놀이패가 동원돼 분위기를 고조시키기도 했다. 한 참가자는 "아크테릭스 브랜드 깃발과 한국의 전통 문화 사물놀이가 결합된 풍경이 독특한 분위기를 냈다"며 "덕분에 더욱 즐겁게 경기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수많은 참가자가 장안산 정상을 향해 가고 있다. 사진=아크테릭스 아크테릭스 마케팅 담당자는 "이번 레이스는 단순한 기록 경쟁을 넘어, 산과 자연을 존중하는 문화와 마운틴 러닝의 본질을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편집자주] 기후변화는 인류의 위기다. 이제 모두의 '조별 과제'가 된 이 문제는, 때로 막막하고 자주 어렵다. 우리는 각자 무얼 할 수 있을까. 문화 속 기후·환경 이야기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끌고, 나아갈 바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산2 일원에서 산불진화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4.7/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재해는 반복되고, 해법은 늘 비슷하다. 봄철이 시작하자마자 영남권을 중심으로 대형 산불이 이어졌다.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국가유산 재난 경보가 발령되는 등 피해가 막심했다. 태풍급 강풍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지만 겨우내 바싹 마른 대지와 나무가 땔감 역할을 했다. 적은 강수량이 또다시 기후 재난으로 연결됐다.유엔대학 환경 및 인간안보연구소(UNU-EHS)는 이런 반복되는 재난의 원인을 기술 부족이 아닌 '사회구조 그 자체'로 지목했다. 최근 공개한 '상호 연결 재해위험'을 통해 UNU-EHS는 기후·생태·오염 위기가 겹치는 현상이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닌, 인간이 만든 시스템에 깊이 뿌리내린 결과라고 분석했다.지금까지의 대응이 폐기물 재활용, 기술적 보완 등 결과 처리에 집중돼 왔으며, 문제를 낳는 사회 시스템과 가치관은 그대로 유지됐다고 진단했다.보고서는 '딥체인지'(Deep Change)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조적 전환 없이 반복되는 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취지다. 플라스틱 폐기물과 산불, 생물종 멸종 등의 문제는 개별 사안이 아니라, 성장 중심의 경제체계와 '새것이 낫다'는 소비 관념, 인간이 자연을 통제 대상으로 여기는 인식이 뿌리가 됐다고 보는 것이다. 사회 문제를 나무 열매에 비유하며, 과일만 갈아치우면 안 되고 뿌리를 바꿔야 한다고 표현했다.전환이 시급한 분야로는 △폐기물 개념 재고 △인간-자연 관계 재조정 △책임 구조 재정의 △미래세대 고려 △가치관 재정립 등이 제시됐다. 예를 들어, 일본 도쿠시마현 가미카쓰는 고도의 분리배출과 지역 공동체 중심의 순환 시스템을 통해 재활용률을 80%까지 끌어올렸고, 미국 플로리다의 키시미강은 훼손됐던 생태계 복원 이후 홍수 완충 기능을 회복하며 자연 기반 해법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기후위기의 책임이 평등하지 않다는 점도 강조된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국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