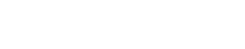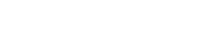제목
[파이낸셜뉴스] 본초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oreo
등록일
2025-05-10
조회수
16
관련링크
본문
[파이낸셜뉴스] 본초여담(本草餘談)은 한동하 한의사가 한의서에 기록된 다양한 치험례나 흥미롭고 유익한 기록들을 근거로 이야기 형식으로 재미있게 풀어쓴 글입니다. <편집자주> 견문발검(見蚊拔劍)이나 노승발검(怒蠅拔劍)은 아주 사소한 일에 크게 대응을 한다는 의미로 아주 작은 일에도 너무 크게 화를 내면서 큰 노력을 기울이는 태도를 비유하는 말이다. 챗GPT에 의한 AI생성 이미지. 하루는 공자가 제자 몇 명을 데리고 무성(武城)이란 고을을 찾아갔다. 그곳에는 제자인 자유(子遊)가 그 수령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겸사겸사 방문해 보고자 했던 것이다. 공자가 성문을 지나 고을 안으로 들어서자, 어디선가 거문고 소리와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멀리서 보니 농사꾼들이 손에 흙을 묻힌 채 노래를 부르고 아이들이 리듬에 맞춰 박수를 치고 있었다. 사실 당시 일반 백성들은 ‘먹고’ ‘사는’ 것도 벅찼기 때문에 예(禮)와 악(樂)에 대해서는 감히 관심조차 없었던 시기다. 자유가 공자가 왕림한 것을 보고 알현을 했다. 공자는 조용히 웃으며 “닭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까지 써야 하겠는가?”라고 중얼거렸다. 공자의 말은 ‘작은 고을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그렇게까지 정성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는 의미였다. 곁에 있던 제자들이 슬며시 웃었다. 공자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자유를 비웃는 듯했다. 그러자 자유가 정색하며 “스승님, 저는 예전에 스승님으로부터 ‘군자가 도를 배우면 사람을 사랑하고, 백성이 도를 배우면 부리기 쉬워진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을 백성들에게도 예와 악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공자는 순간 눈빛이 부드러워지더니 방금 전까지 비웃던 제자들을 돌아보며 “보거라, 자유의 말이 옳다. 내가 방금 한 말은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일 뿐이다. 자유의 말이 참으로 옳구나.”라고 했다. 제자들은 얼굴이 붉히며 자유에게 고개를 숙였다. ‘할계언용우도(割鷄焉用牛刀)’는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쓴다’는 의미로 요즘도 작은 일을 하는 데 지나치게 큰 수단을 쓰지 말라는 교훈으로 오늘날에도 자주 쓰인다. 이는 자유처럼 ‘닭’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소 잡는 칼도 필요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와 비슷한 사자성어로 견문발검(見蚊拔劍)이 있다. 먼 옛날 왕사(王思)는 조조에게 인정받아 대사농(大司農)까 [파이낸셜뉴스] 본초여담(本草餘談)은 한동하 한의사가 한의서에 기록된 다양한 치험례나 흥미롭고 유익한 기록들을 근거로 이야기 형식으로 재미있게 풀어쓴 글입니다. <편집자주> 견문발검(見蚊拔劍)이나 노승발검(怒蠅拔劍)은 아주 사소한 일에 크게 대응을 한다는 의미로 아주 작은 일에도 너무 크게 화를 내면서 큰 노력을 기울이는 태도를 비유하는 말이다. 챗GPT에 의한 AI생성 이미지. 하루는 공자가 제자 몇 명을 데리고 무성(武城)이란 고을을 찾아갔다. 그곳에는 제자인 자유(子遊)가 그 수령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겸사겸사 방문해 보고자 했던 것이다. 공자가 성문을 지나 고을 안으로 들어서자, 어디선가 거문고 소리와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멀리서 보니 농사꾼들이 손에 흙을 묻힌 채 노래를 부르고 아이들이 리듬에 맞춰 박수를 치고 있었다. 사실 당시 일반 백성들은 ‘먹고’ ‘사는’ 것도 벅찼기 때문에 예(禮)와 악(樂)에 대해서는 감히 관심조차 없었던 시기다. 자유가 공자가 왕림한 것을 보고 알현을 했다. 공자는 조용히 웃으며 “닭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까지 써야 하겠는가?”라고 중얼거렸다. 공자의 말은 ‘작은 고을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그렇게까지 정성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는 의미였다. 곁에 있던 제자들이 슬며시 웃었다. 공자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자유를 비웃는 듯했다. 그러자 자유가 정색하며 “스승님, 저는 예전에 스승님으로부터 ‘군자가 도를 배우면 사람을 사랑하고, 백성이 도를 배우면 부리기 쉬워진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을 백성들에게도 예와 악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공자는 순간 눈빛이 부드러워지더니 방금 전까지 비웃던 제자들을 돌아보며 “보거라, 자유의 말이 옳다. 내가 방금 한 말은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일 뿐이다. 자유의 말이 참으로 옳구나.”라고 했다. 제자들은 얼굴이 붉히며 자유에게 고개를 숙였다. ‘할계언용우도(割鷄焉用牛刀)’는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쓴다’는 의미로 요즘도 작은 일을 하는 데 지나치게 큰 수단을 쓰지 말라는 교훈으로 오늘날에도 자주 쓰인다. 이는 자유처럼 ‘닭’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소 잡는 칼도 필요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와 비슷한 사자성어로 견문발검(見蚊拔劍)이 있다. 먼 옛날 왕사(王思)는 조조에게 인정받아 대사농(大司農)까지 지냈다. 그런데 성격이 아주 급하고 고집이 셌다. 왕사가 어느 날 그는 글을 쓰고 있었는데, 자꾸만 파리 한 마리가 붓끝에 날아들었다. 두어 번 쫓아냈지만 또다시 날아오자, 결국 그는 벌떡
상위노출 상위노출 사이트 쿠팡배송기사 디시인사이드자동댓글 웹SEO 쿠팡배송기사 네이버상위노출대행 구글상단노출업체 네이버마케팅프로그램 구글상단작업 디시인사이드자동댓글 마케팅프로그램 다산동부동산 부산 헌옷방문수거 마케팅프로그램 네이버상단작업 사이트상위노출 네이버상위노출 홈페이지상위노출 네이버마케팅프로그램 플레이스상위 마케팅프로그램판매 네이버상단작업 마케팅프로그램판매 홈페이지상위노출 상위노출 구글상단작업 웹사이트상위노출 구글상단노출 상위노출 사이트 웹사이트상위노출 네이버상위노출 네이버상위노출대행 구글상단노출 웹SEO 부산 헌옷방문수거 구글상단노출업체 다산동부동산 사이트상위노출 플레이스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