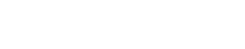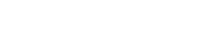[서울=뉴시스] 안동 병산서원 살수 작업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5.03.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2023년 강릉 산불도 경험했지만 이번(영남권 산불)처럼 며칠 동안 불길이 잡히지 않아 사람들을 밤낮없이 괴롭혔던 적은 없었어요."지난 일주일간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으며 기세를 떨쳤던 화마는 국가 유산들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신라 의상대사가 창건한 고운사, 산불이 휩쓸고 간 천년고찰은 폐허로 변했다. 조선시대 건축양식이 잘 보존돼 지난해 보물로 지정된 가운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400년 역사의 고택도 화마에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국가유산청이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집계한 산불 관련 국가유산 피해는 총 35건이다. 국가지정 문화유산은 보물 3건, 명승 4건, 천연기념물 3건, 국가민속문화유산 3건 등 13건이다. 시도지정 문화유산은 유형문화유산 4건, 기념물 3건, 민속문화유산 6건, 문화유산자료 9건 등 22건에 달했다.그러나 한때 소실됐다고 알려진 안동 만휴정이 기적적으로 '생환'했고, 옮길 수 있는 불상과 탱화, 현판 등은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다. 불에 약한 목조건물엔 전면을 방염포로 덮어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다. 우리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오롯이 담은 문화유산을 화마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산불 현장으로 달려간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23일 국가유산 재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발령했다. 사상 첫 조치다. 국가유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원 750명을 산불 현장에 급파했다. [서울=뉴시스]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이운 준비 중인 봉정사 문화유산들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5.04.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안동 하회마을과 봉정사, 영주 부석사에 대한 긴급 조치에 나섰다. 안동 봉정사와 영주 부석사에서는 유물들을 긴급 이송 조치했고 바로 앞까지 산불이 번진 하회마을, 병산서원에서는 민속유산팀과 역사유적정책과 직원들을 보냈다. .현장에 나갔던 국가유산청 직원[김종성 기자]한 편의 영화 같은 독립군 전투가 있었다. 어쩌다 보니 영화처럼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영화 시나리오 같은 각본 하에서 전개된 전투다. 국가보훈부의 <독립운동사> 제7권이 '차련관 의거'로 지칭한 1925년 7월 5월의 항일전투는 한 편의 영화라는 수식어를 붙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의거'라는 용어는 1983년에 <독립운동사>를 펴낸 원호처(국가보훈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가 사용한 표현이다. 그런데 이 전투는 정의부에서 기획하고 실행했다. 정의부는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기능이 약해지던 1924년에 만주에서 수립돼 독립운동단체의 연합기구 혹은 준정부 역할을 했다. 주로 개인이나 민중의 거사를 표현하는 데에 사용되는 의거라는 용어는 이 전투와 어울리지 않는다.전투는 평안북도 해안 지역인 철산군 차련관(車輩舘)에서 일어났다. <독립운동사>는 이곳을 차련관으로 표기하지만, 이 지명은 여러 발음으로 불린다. 일례로, 국사편찬위원회가 운영하는 <조선왕조실록> 사이트는 차련관을 차연관으로도 표기하고 거련관 혹은 거연관으로도 표기한다. 여기서 일어난 독립군 전투가 널리 알려져 이곳 지명이 많이 회자됐다면 이 지명 표기에 관한 국가보훈부와 국사편찬위원회의 합의가 이뤄졌을 수도 있다.일본인 경찰이 있는 주재소를 습격한 독립운동가들▲ 일본 헌병 주재소가 애국지사들에 의해 불타는 장면이 재현되고 있다. (기사와는 관련 없음)ⓒ 연합뉴스 1925년 7월 3일, 평북 철산군 차련관 뒷산에 7인의 무장 독립군이 나타났다. <독립운동사>는 "정의부 군사부 별동대원 이진무·홍학순·김광진·김인옥·이창만·오동락" 여섯 명만 언급한다. 원호처의 후신인 국가보훈처가 1987년에 발간한 <독립유공자공훈록> 제4권 김광진 편은 김광진이 "이진무·홍학순·김인옥·김학규·이창만·오동락 등 6명"과 함께 참여했다고 말한다. 공훈록은 김학규(金學圭)를 추가로 언급한다. 이 김학규는 임시정부 한국광복군 참모를 지낸 독립운동가 김학규(金學奎, 1900~1967)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광복군 참모 김학규에 관한 기록에서는 이 전투가 나타나지 않는